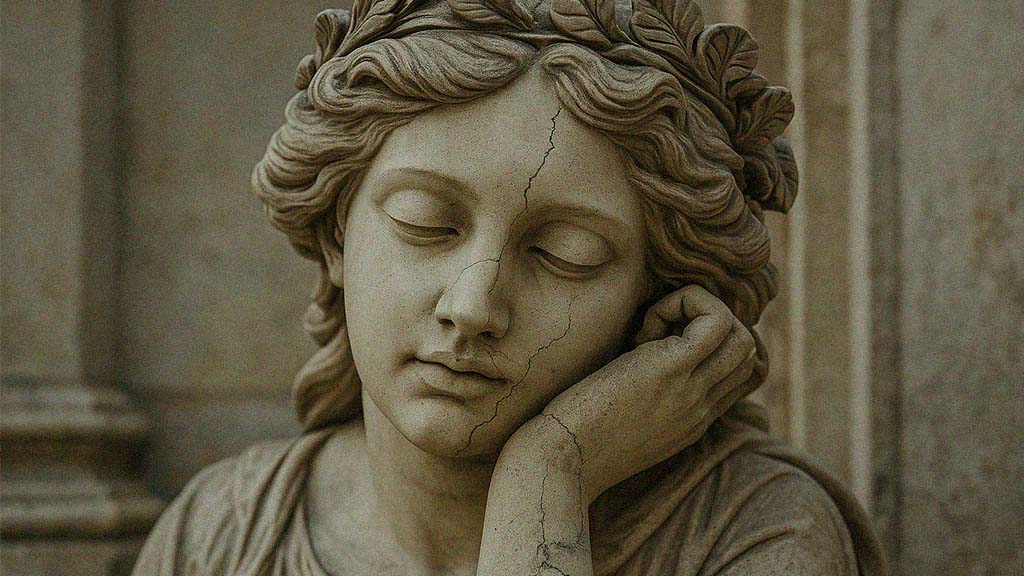
글 읽기 : 플라톤 - 에우튀프론
1. 당신이 <에우튀프론>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10~16)
플라톤의 <에우튀프론>은 그 전체가 헛소리다. <에우튀프론>에서 소크라테스는 “경건함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에 에우튀프론은 그 대답 중 하나로 “신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에우튀프론이 정의한 경건함은 진정한 경건함이 아니라 반박하면서 대화를 이어 나간다. 그리고 이 대화 전체가 헛소리다.
여기서는 하나만 알면 된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실재론자들은 “What is this?”를 묻는다. 이들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요소에 의해 정의(Define)되지 않는 순수한 정의(Definition)를 원한다. 내가 만약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물을 주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하면 플라톤을 비롯한 실재론자들은 분개한다. 내가 ‘사랑’을 설명하는데 ‘선물’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실재론자들은 다른 개념을 빌려오지 않고 ‘오직 그 자체(Idea)’ - 칸트의 말로는 물자체(Thing in itself) - 를 설명하길 원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모든 건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서만 정의(Define)된다. 나라는 존재는 타인을 가정해야만 성립한다. 물론 이런 성찰은 플라톤이 죽고 난 후 한참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에우튀프론>이 헛소리인 이유는 경건함을 그 자체로 설명하려하기 때문이다. 경건함이라는 개념 역시 다른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문장 속에서 단어가 존재하고 사회 속에서 개인이 존재하듯 개념 역시 다른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플라톤 철학 전체가 헛소리인데 우리는 한 번쯤은 플라톤을 읽어보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재론적인 시대착오에 빠져있어서 헛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시대착오에 빠진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지 알려면 플라톤을 읽을 필요가 있다.
2. 민주주의는 옳고 그름을 포기했다(2~5c)
우리는 에우튀프론을 읽으며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게 된다. 우리는 그 주먹을 소크라테스의 면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그의 못생긴 얼굴을 조금 더 못생기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