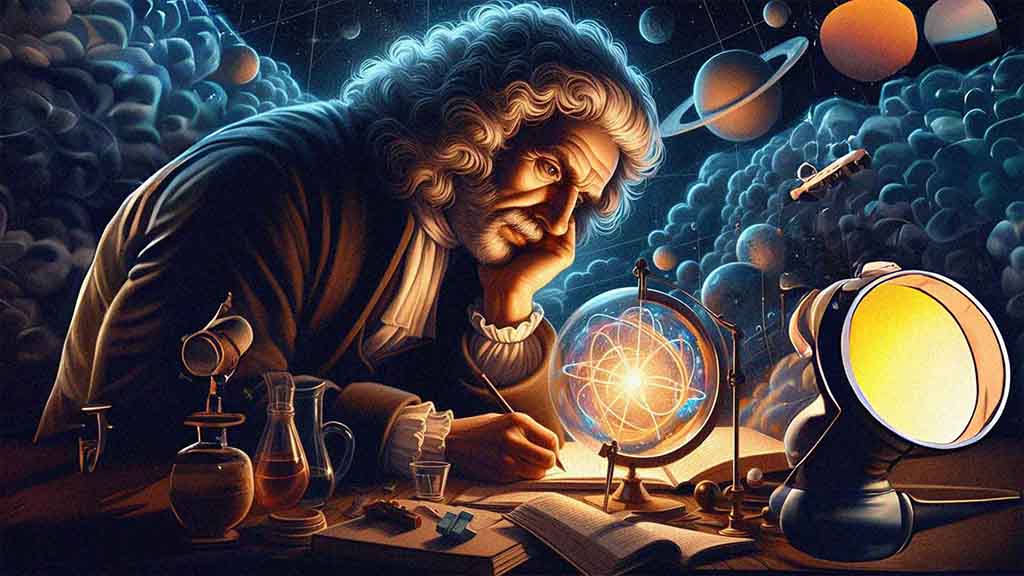
철학적 분석 : 뉴턴의 과학은 함수이고 함수는 인간을 도구로 만들었다
아래는 바로크 미술에 대한 분석을 읽고 구독자가 보내신 편지다. 매우 맞는 말이라 여기에 올린다.
.
함수에 대해, 그리고 함수를 세계관으로 하는 미술인 바로크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창 시절에 주말마다 에어컨 조립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조립 레일 옆에 서서 벽걸이 에어컨 조립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었는데(국적은 모르지만 동남아인 건 확실합니다) 그분들은 한국인이 받는 일당의 60%를 받았습니다.
일은 매우 지루했고 저는 철학자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노동소외’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나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건 기쁨이고 작품입니다. 그러나 레일 옆에서 하는 에어컨 조립은 제게 그 어떤 창의성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저는 단지 에어컨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극히 일부분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즉, 저는 생산함수의 변수일 뿐입니다. 데카르트는 연장을 말하며 살아있는 유기물조차 무기물로 만들었고 그것이 곧 해석 기하학입니다. 만약 공장 사장님께서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공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에게 있어 저는 하나의 생산 요소일 뿐이요, 만약 제가 적절한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기계 부품을 교체하듯 저를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로 대체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역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값싼 부품일 뿐입니다.
이게 데카르트의 세계이고 뉴턴의 세계이고 바로크의 세계입니다. 좌표평면과 함수의 발견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y=F(x)라는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분업으로 첫 장을 시작하는데, 분업이 곧 함수이며 그렇기에 현대 경제학 역시 데카르트가 만든 세계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함수의 도입으로 인간 역시 무기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라는 요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