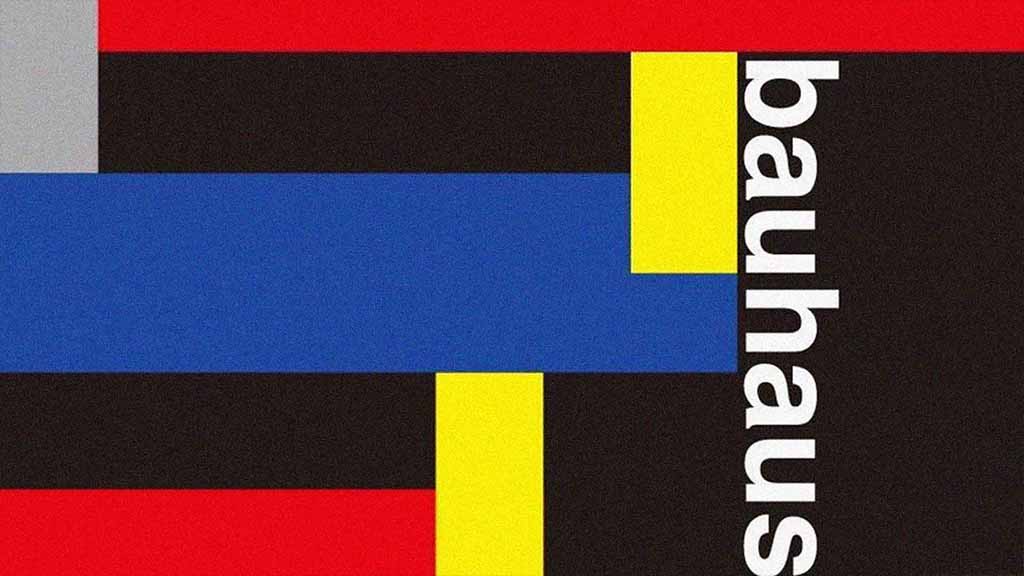
철학적 분석 : 현대를 살기 위해서는 현대의 세계관을 인식해야만 한다
세계는 세계관의 반영입니다. <소립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가는 ‘형이상학적 돌연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는 ‘형이상학적 돌연변이’가 제가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저는 꽤 많은 글에서 플라톤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플라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플라톤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틀렸을 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플라톤이 맞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중세 기독교에 귀의했던 고대인들이 그랬듯이 실재론적 세계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플라톤이 맞고 비트겐슈타인이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현재만을 살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따라 지금은 비트겐슈타인이 맞고 플라톤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며 철학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축적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세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현대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중세 시대에서도 살 수 있고 근대 시대에서도 살 수 있으며 현대 시대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열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연속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우연에 의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대-중세-근대-현대는 서로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도대체 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그것도 피렌체에서 발생했는가?” 모릅니다. 우리는 또 묻습니다. “도대체 왜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그것도 아테네에서 발생했는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피렌체에서 발생한 르네상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이고 아테네에서 발생한 민주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근본적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상황을 기술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역사학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근대가 발생했을까?” 그리고 과거의 역사학은 중세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중세 시대의 모순을 말하고 그에 따라 중세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역사학자도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말합니다. “모른다. 그냥 어느 날 근대가 찾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역사에 다가가야 하나요? 우리는 고대-중세-근대-현대를 연결시키지 말고 분리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차이’에 집중하여 각 시대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대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다고 합의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현대가 어떤 세계관 아래에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만 공부해서 현대를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현대는 다른 시대와의 ‘차이’에서 그 정체성을 확보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현대의 세계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